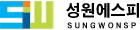[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ns339 댓글: 0 조회수: 6 날짜: 2025-09-30본문
통화후자동문자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30일 정부과천청사를 떠나는 마지막 퇴근길에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2025.09.30. silverline@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 폐지로 임기를 못마치고 물러나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30일 "대한민국의 법치는 오늘 죽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1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를 떠나는 마지막 퇴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회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그는 "현행 법대로 되지 않으면 법을 바꿔서 사람을 제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방통위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꿔서 사람을 잘라낼 수 있다. 그럼 다음에 어느 정부가 될지는 몰라도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음에 들지 않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잘라낼 수 있는 첫번째 사례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취임 사흘 만에 탄핵을 했고 그런 선례를 만들어냈는데 방미통위라는 새 기관을 만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또 했다"며 "정말 참 대단하구나 생각한다. 오늘 이진숙이라는 사람은 숙청되지만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을 참지 못하는 또 다른 이진숙이, 저항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는 물러난다"고 언급했다.이 위원장은 헌법소원을 예고한 상태다.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받아들이겠냐는 질문에는 "가정적인 질문을 했기 때문에 다시 만나면 답변하겠다"고 말을 아꼈다.새로운 위원장에게 당부할 말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말을 안 듣는다고 잘라내는데 아무래도 대통령 말을 잘 듣는 분이 오지 않겠냐"고 덧붙였다.이 위원장은 이날 출근해 직원들과 월례조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기자일 때) 주로 미국과 중동에 있었는데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며 "미국은 건국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을 수도 워싱턴DC에 이름을 붙이고 수많은 장소에 남기지만 대한민국의 영웅은 없다. 세종대왕, 이순신 등 조선시대 영웅만 이야기하는데 현대의 대한민국 영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소개했다.이 위원장은 마지막에 차량에 올라타면서 기자들에게 "수고 많았다. 굿바이 앤 씨유(Good bye and see you) ▲ 문무학 시조집 『세종의 처방전』 한글을 시의 재료로 삼아온 문무학 시조시인이 열한 번째 시조집 '세종의 처방전'(책만드는집 시인선 268)을 펴냈다. '낱말'(2009)을 시작으로 '홑', '가나다라마바사', '뜻밖의 낱말' 등 한글 연작 시조를 통해 독자적인 시세계를 구축해온 그는 이번 신작에서 초성·중성·종성 68개의 소리를 시어로 풀어내며 언어의 본디 결을 다듬는 시적 실험을 이어간다.문무학 시조시인은 훈민정음 서문체로 쓴 '시인의 말'에서 이번 시집의 문제의식을 분명히 밝혔다. '나랏말씀에 이 나라 저 나라 말이 섞이고, 지나치게 줄여 쓰며, 듣기 거북하게 거칠어져 서로 잘 통하지 않게 된 현실을 안타깝게 여겨 바르고 고운 한글 쓰기를 회복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초성·중성·종성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언어 단위로 시를 짓는 일은 단순한 언어 유희가 아니라, 훼손된 말의 결을 어루만지고 언어의 품격을 다시 세우려는 시인의 윤리이자 실천이다.대표작 '세종의 처방전 – 첫소리 'ㄲ''에서 그는 소리의 반복이 지닌 힘을 재치 있게 포착한다.'깔끔 깨끗 한글에 쌍기역이 많은 것은 / 기역 한 번 써서는 모자라기 때문이다 / 깔끔과 깨끗에 어찌 한 번 만에 될 일이야.'쌍기역이라는 음소가 가진 물리적 힘과 말맛을 '깔끔', '깨끗'이라는 낱말과 결합시켜 단어·소리·의미의 삼각 구조를 시조 안에서 조화롭게 엮는다.'세종의 처방전 – 가운뎃소리 'ㅏ''에서는 여는 소리의 활력을 다음과 같이 노래한다.''아'는 여는 소리 닫힌 것들 열어준다 / 아침이 하루 열고 아지랑이 봄을 열 듯 / 사람의 아름다움은 고운 말로 열린다.'음운론적 성격을 시의 세계로 끌어온 그의 솜씨는 단순한 언어학적 설명을 넘어, 말과 삶, 소리와 세계가 연결되는 지점을 시적으로 사유하게 만든다.또 다른 작품 '세종의 처방전 – 끝소리 'ㄶ''에서는 종성의 역할을 시적 이미지로 풀어낸다.'ㄶ 겹받침은 끊을 것 뚝 끊어내고 / 많아야 할 것은 떠받쳐 많게 하니 / '괜찮다' 말에 안겨 안겨도 밉지도 않으니라.'언어 구조를 해부하듯 다루면서도 '괜찮다'라는 말이 품은 정서적 온기를 길어 올리는 대목에서 문무학 시조의
통화후자동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