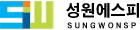릴게임한국 ⌒ 바다이야기#릴게임 ㎃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선진휘미 댓글: 0 조회수: 1 날짜: 2025-11-13본문
바다이야기꽁머니 ㉰ 10원야마토게임 ♂
릴게임끝판왕 바로가기 go !!
-지방 행정의 달인이었다
‘선조수정실록’에 의병장 최경회의 졸기(卒記)가 다음처럼 기록돼 있다.
“최경회는 동서로 적을 초토하느라 1년 넘게 노숙하였으나, 뜻이 조금도 태만해지지 않았다. 병사(兵使, 경상우병사)에 승진되어서는 처사가 정밀하고 민첩하였으며, 호령이 엄하고 분명하였으므로 사람들이 그를 믿고 의지하였다. 김천일과 함께 통수(統帥)가 되어 같이 있으면서 명령을 내렸는데, 한 번도 상반되는 적이 없었다. 진주성이 함락되자, 막사(幕士) 문홍헌 등과 함께 물에 뛰어들어 죽었다.”
의병장 최경회 영정
제2차 진주성 전투의 통수, 즉 총사령관이었던 임진 의병장 최경회(崔慶會, 1532-1593), 자는 선우(善遇)이고 호는 일휴당(日休堂)이며 본관은 해주다. 153 2년(중종 27) 전남 화순읍 삼천리에서 최천부와 순창 임씨 사이에 태어난다.
어린 시절 송천 양응정 문하에서 수학했고, 1557년(명종 12) 고봉 기대승을 찾아가 가르침을 받았다. 30세인 1561년(명종 16), 생원 진사시에 합격한 후 1567년(선조 즉위년) 문과에 급제했다. 그는 성균관 전적을 시작으로 사헌부 감찰, 형조정랑, 사도시정 등을 역임했다. 1587년(선조 20) 내직에서 맡은 마지막 관직은 정5품 사도시정(司 寺正)이었다. 사도시는 조선시대 궁중 창고의 미곡과 궁내에 보급되는 장(醬) 등의 물품을 맡아보는 관청이었다.
그는 주로 외직에 근무했다. 흥양, 옥구, 장수, 무장 현감에 이어 영암 군수, 영해 군수 를 지낸다. 마지막 받은 관직이 1587년(선조 20) 받은 담양 부사였다.
최경회 기마상(충의사 경내)
장수 현감 시절 숙부가 민며느리로 팔아버린 5살 어린 논개를 구한 인연으로, 후일 논개는 최경회의 후처가 됐고, 제2차 진주성 전투에 참여한 후 ‘의암’에서 적장을 껴안고 진주 남강에 몸을 던진다. 논개가 ‘의암부인’으로 불리는 이유다.
최경회는 지방 행정의 전문가였다. 부임지마다 선정을 베풀자, 옥구·무장·영암 주민들은 송덕비를, 장수·영해 주민들은 선정비로 화답했다. 지금 영해 면사무소 앞에는 ‘부사최공경회선정비’(府使崔公慶會善政碑)가 서 있다. 특히, 영해 주민들은 선정비뿐만 아니라 생사당(生祠堂)을 건립해 고마움을 표하기도 했다. 생사당이란 감사(관찰사)나 수령의 공적을 고맙게 여겨, 살아생전 받들어 모시기 위하여 지은 사당을 말한다.
충의사 전경(화순군 동면)
최경회 사당, 충의사
-임진왜란 의병장이 되다
1592년(선조 23) 임진왜란이 발발했을 당시 최경회는 모친상(喪)을 당해 화순에서 시묘살이 중이었다. 고경명 휘하에서 활동하던 문홍헌이 화순 동복 일대에서 군량을 모으던 중 고경명의 패전 소식을 듣고, 최경회를 찾아 거병해 줄 것을 간청한다.
최경회는 “이제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으니 내 몸을 나라에 바쳐도 된다. 부모에게 효도하듯 이 나라에 충성을 다 하겠노라”라며, 문홍헌의 요청을 수락한다.
그의 나이 예순한 살이었다. 최경회는 맏형 최경운, 둘째 형 최경장과 함께 화순읍 삼천리 ‘고사정’(高士亭)터에 의병청을 설치한다. 최경회 3형제는 물론 조카인 최홍재와 최홍우, 아들 최홍기도 함께 했다.
최경회는 모친 신위에 곡을 마치고 검은 상복 차림으로 단상에 올라 의병장이 돼 각 고을에 격문을 보내자, 화순과 인근에서 800여 의병이 모인다.
송대창을 전부장, 허일을 후부장, 고득뢰를 좌부장, 권극평을 우부장으로 삼고, 문홍헌을 참모장에 임명한다. 의진 이름을 ‘전라우의병’이라 하였고 송골매라는 뜻의 ‘골(鶻)’자가 새겨진 깃발도 제작했다. 깃발에 새겨진 ‘골’은 골입아군(鶻入鴉群)이라는 글귀에서 따온 것인데, “송골매가 까마귀 무리 속으로 들어가 휘집고 다니면서 흩어지게 한다”는 뜻을 품고 있다. ‘골’은 최경회 의병을, ‘아’는 왜군을 의미함은 물론이다.
의진이 꾸려지고 군사가 확충되자, 최경회는 전라우의병을 거느리고 한양으로 북상 중 전라감사 권율의 요청에 의해 현감을 지낸 적이 있는 장수에 주둔한다. 장수에 주둔하면서 금산에서 퇴각하는 왜군과 싸워 큰 승리를 거둔다. 그중 하나가 왜군의 진로에 의병을 매복시켜 큰 승리를 거둔 우지치(牛旨峙) 전투였다. 이를 무주대첩이라 부른다.
최경회 의병장은 문과 급제자였지만 명궁수(名弓手)였다. 최경회가 명궁수였음은 1574년(선조 7) 5월 2일자 ‘선조실록’에 “문신 2품 이하에게는 활쏘기를 시험했는데 최경회가 25분(分)으로 장원했다(文臣二品以下竝試射 而崔慶會以二十五分爲魁)”는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그는 200보 밖의 왜군 장수를 쏘아 거꾸러뜨린 후 머리를 베고 큰 칼을 노획한다. 큰 칼은 자루가 길고 칼날이 등 쪽으로 휘어진 언월도(偃月刀)였는데, 칼날에 ‘모루미치(盛道) 작(作)’이라는 제작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이 칼은 도요토미 히데요시(豐臣秀吉)가 다이묘(大名)급 장군에게 하사한 칼로 알려져 있다.
-진주성으로 달려가다 최경회는 장수에서 남원으로 진을 옮긴다. 전라도 진격에 실패한 왜가 경상도로 물러났기 때문이다. 최경회가 남원에 머무르고 있을 때, 영남 의병장 김면과 경상우도 관찰사 김성일이 원군을 요청한다. 최경회의 부장들은 “지금 적군의 기세가 사방으로 뻗치고 있는데, 어찌 호남을 버리고 멀리 영남 우도를 구원해야 하느냐”며 구원 요청을 반대하였다. 이때 최경회는 “호남도 우리 땅이요, 영남도 우리 땅인데 의(義)로써 일어난 사람들이 멀고 가까움을 가리겠는가”라고 말하면서, 경상도로 달려간다.
최경회는 전라우의병을 이끌고 진주 살천에 주둔하면서 제1차 진주성 전투를 외곽에서 지원한다. 이는 제1차 진주성 전투에 대한 경상우도 관찰사 김성일이 경상도 지역의 전투 상황을 보고한 장계에 “경상도 의병장 곽재우는 동쪽으로부터 들어가고, 전라 의병 최경회는 서쪽으로부터 들어가고, 고성 의병장 조응도는 남쪽으로부터 들어가게 하였습니다”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제1차 진주성 전투 당시 보성 출신으로 전라좌의병을 이끈 임계영도 함양으로 진출했다.
진주목사 김시민은 최경회를 비롯한 전라 의병장들의 외곽 지원을 받아 제1차 진주성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다.
당시 최경회와 임계영의 의병부대는 막강했다. 1592년 12월 9일자 ‘선조실록’에 “각도의 의병 가운데 곽재우·최경회·임계영이 거느린 군사는 쓸만해 보입니다. 이들 세 사람이 바야흐로 경상도에 있으니 급히 군사를 정돈하여 근왕(勤王)케 하자”는 비변사의 건의를 통해서도 짐작된다. 그러나 비변사의 건의는, 경상도에서 전라도 의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상소가 잇따르자, 철회된다.
1593년 3월 경상우병사 김면이, 동년 4월에는 경상우도 관찰사 김성일이 전염병으로 쓰러진다. 그러자 조정에서는 최경회를 경상우병사에, 김륵을 경상우도 관찰사에 임명한다. 그런데 경상우도 관찰사에 임명된 김륵이 전시에 관찰사 업무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 조정에서 논란이 일었고, 그 대체 인물 1순위가 경상우병사에 임명된 최경회였다. ‘선조실록’에는 “최경회는 새로 병사(兵使)에 임명되었는데, 이 사람은 침착하고 중후하며 지략이 있어 감사(監司, 관찰사)에 합당하니, 그로 하여금 대신하게 하소서. 그 다음으로는 이시언과 곽재우도 임명할만 합니다”라고 대신이 아뢰고 있다. 당시 최경회가 임명되지는 않았지만, 이시언과 곽재우를 제치고 경남우도 관찰사 제1순위 후보였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진주 남강에 몸을 던지다 제1차 진주성 대첩은 임진왜란 최초로 성을 지켜낸, 전라도로 진출하려던 왜군의 계획을 좌절시킨 귀중한 승리였다. 그러자 이듬해인 1593년 7월, 왜군은 전라도로 통하는 관문을 확보하고 제1차 진주에서의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 10만의 병력을 집중하여 함안·의령을 차례로 점령하고 진주성을 공격한다. 당시 조정은 방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진주성을 포기하라는 명을 내렸고, 도원수 권율과 경상도 의병장 곽재우마저도 진주성에서 10만의 왜군을 상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여 반대한다. 심지어 곽재우는 진주성에 입성하는 충청병사 황진에게 “진주성은 고성(孤城)이어서 지키기 어렵고, 그대는 충청도 절도사인데 진주성을 지키다 죽는 일은 맡은 바가 아니다”라고까지 하였다.
조정이 포기하고 경상도 의병장 곽재우마저 포기한 진주성을 지키기 위해 진주성에 들어간 것은 김천일, 최경회, 고종후, 황진 등이 이끄는 3천5백의 호남 의병과 진주목에 머물던 관군 뿐이었다.
진주성에서는 새로 지휘부가 구성된다. 총사령관 격인 우도 절제사(節制使)는 창의사 김천일이, 좌도 절제사는 경상우병사 최경회가 맡아 의병은 김천일이, 관군은 최경회가 군령을 내렸다. 도순성장(都巡城將)은 충청병사 황진의 몫이었다.
1593년 7월 22일부터 시작된 제2차 진주성 전투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다. 관군과 명군의 지원 없이 9일을 버텨냈지만, 28일 충청병사 황진이 이마에 탄환을 맞고 사망하였고, 29일 성이 함락된다.
진주성이 함락되자 경상우병사 최경회는 “촉석루의 세 장사는(矗石樓中三壯士)/ 한잔 술을 들고 웃으며 긴 강물을 가리키네(一杯笑脂長江水)/ 긴 강물은 도도히 흘러가는데(長江之水流滔滔)/ 저 물결 흐르는 한 혼도 죽지 않으리(波不竭兮魂不死)”라는 시를 남기고 남강에 몸을 던진다. 그의 나이 예순 둘이었다. 이 시 속의 세 장사는 창의사 김천일과 고경명의 장남인 복수의병장 고종후, 최경회 자신을 가리킨다.
왜군은 진주성을 함락했지만, 큰 손실을 입어 전라도 진출이 좌절된다. 전라도 의병들이 몸을 던져 그들을 막아낸 것이다.
삼장사 시비(충의사 경내)
노성태·남도역사연구원장
최경회가 진주 남강에 투신한 지 150여 년 뒤인 1746년(영조 22), 최경회의 도장(圖章)이 남강 물가에서 발견되었고, 영조는 도장을 넣는 갑을 만들어 소중히 보관하게 한 뒤 ‘충절’의 상징으로 삼는다.
일휴당 최경회, 1753년(영조 29) 충의(忠毅)라는 시호가 내려지고 좌찬성에 추증된다. 그리고 진주의 창렬사, 화순의 삼충각에 배향된다. 2003년 화순군 동면 백용리에 건립된 충의사에는 사당을 비롯하여 기념관, 동상, 어록비 등이 있다. 후처로 ‘의암’에서 왜장을 껴안고 진주 남강에 투신한 논개의 영정을 모신 ‘의암영각’도 있다.
<노성태·남도역사연구원장> 기자 admin@slotnara.info
‘선조수정실록’에 의병장 최경회의 졸기(卒記)가 다음처럼 기록돼 있다.
“최경회는 동서로 적을 초토하느라 1년 넘게 노숙하였으나, 뜻이 조금도 태만해지지 않았다. 병사(兵使, 경상우병사)에 승진되어서는 처사가 정밀하고 민첩하였으며, 호령이 엄하고 분명하였으므로 사람들이 그를 믿고 의지하였다. 김천일과 함께 통수(統帥)가 되어 같이 있으면서 명령을 내렸는데, 한 번도 상반되는 적이 없었다. 진주성이 함락되자, 막사(幕士) 문홍헌 등과 함께 물에 뛰어들어 죽었다.”
의병장 최경회 영정
제2차 진주성 전투의 통수, 즉 총사령관이었던 임진 의병장 최경회(崔慶會, 1532-1593), 자는 선우(善遇)이고 호는 일휴당(日休堂)이며 본관은 해주다. 153 2년(중종 27) 전남 화순읍 삼천리에서 최천부와 순창 임씨 사이에 태어난다.
어린 시절 송천 양응정 문하에서 수학했고, 1557년(명종 12) 고봉 기대승을 찾아가 가르침을 받았다. 30세인 1561년(명종 16), 생원 진사시에 합격한 후 1567년(선조 즉위년) 문과에 급제했다. 그는 성균관 전적을 시작으로 사헌부 감찰, 형조정랑, 사도시정 등을 역임했다. 1587년(선조 20) 내직에서 맡은 마지막 관직은 정5품 사도시정(司 寺正)이었다. 사도시는 조선시대 궁중 창고의 미곡과 궁내에 보급되는 장(醬) 등의 물품을 맡아보는 관청이었다.
그는 주로 외직에 근무했다. 흥양, 옥구, 장수, 무장 현감에 이어 영암 군수, 영해 군수 를 지낸다. 마지막 받은 관직이 1587년(선조 20) 받은 담양 부사였다.
최경회 기마상(충의사 경내)
장수 현감 시절 숙부가 민며느리로 팔아버린 5살 어린 논개를 구한 인연으로, 후일 논개는 최경회의 후처가 됐고, 제2차 진주성 전투에 참여한 후 ‘의암’에서 적장을 껴안고 진주 남강에 몸을 던진다. 논개가 ‘의암부인’으로 불리는 이유다.
최경회는 지방 행정의 전문가였다. 부임지마다 선정을 베풀자, 옥구·무장·영암 주민들은 송덕비를, 장수·영해 주민들은 선정비로 화답했다. 지금 영해 면사무소 앞에는 ‘부사최공경회선정비’(府使崔公慶會善政碑)가 서 있다. 특히, 영해 주민들은 선정비뿐만 아니라 생사당(生祠堂)을 건립해 고마움을 표하기도 했다. 생사당이란 감사(관찰사)나 수령의 공적을 고맙게 여겨, 살아생전 받들어 모시기 위하여 지은 사당을 말한다.
충의사 전경(화순군 동면)
최경회 사당, 충의사
-임진왜란 의병장이 되다
1592년(선조 23) 임진왜란이 발발했을 당시 최경회는 모친상(喪)을 당해 화순에서 시묘살이 중이었다. 고경명 휘하에서 활동하던 문홍헌이 화순 동복 일대에서 군량을 모으던 중 고경명의 패전 소식을 듣고, 최경회를 찾아 거병해 줄 것을 간청한다.
최경회는 “이제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으니 내 몸을 나라에 바쳐도 된다. 부모에게 효도하듯 이 나라에 충성을 다 하겠노라”라며, 문홍헌의 요청을 수락한다.
그의 나이 예순한 살이었다. 최경회는 맏형 최경운, 둘째 형 최경장과 함께 화순읍 삼천리 ‘고사정’(高士亭)터에 의병청을 설치한다. 최경회 3형제는 물론 조카인 최홍재와 최홍우, 아들 최홍기도 함께 했다.
최경회는 모친 신위에 곡을 마치고 검은 상복 차림으로 단상에 올라 의병장이 돼 각 고을에 격문을 보내자, 화순과 인근에서 800여 의병이 모인다.
송대창을 전부장, 허일을 후부장, 고득뢰를 좌부장, 권극평을 우부장으로 삼고, 문홍헌을 참모장에 임명한다. 의진 이름을 ‘전라우의병’이라 하였고 송골매라는 뜻의 ‘골(鶻)’자가 새겨진 깃발도 제작했다. 깃발에 새겨진 ‘골’은 골입아군(鶻入鴉群)이라는 글귀에서 따온 것인데, “송골매가 까마귀 무리 속으로 들어가 휘집고 다니면서 흩어지게 한다”는 뜻을 품고 있다. ‘골’은 최경회 의병을, ‘아’는 왜군을 의미함은 물론이다.
의진이 꾸려지고 군사가 확충되자, 최경회는 전라우의병을 거느리고 한양으로 북상 중 전라감사 권율의 요청에 의해 현감을 지낸 적이 있는 장수에 주둔한다. 장수에 주둔하면서 금산에서 퇴각하는 왜군과 싸워 큰 승리를 거둔다. 그중 하나가 왜군의 진로에 의병을 매복시켜 큰 승리를 거둔 우지치(牛旨峙) 전투였다. 이를 무주대첩이라 부른다.
최경회 의병장은 문과 급제자였지만 명궁수(名弓手)였다. 최경회가 명궁수였음은 1574년(선조 7) 5월 2일자 ‘선조실록’에 “문신 2품 이하에게는 활쏘기를 시험했는데 최경회가 25분(分)으로 장원했다(文臣二品以下竝試射 而崔慶會以二十五分爲魁)”는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그는 200보 밖의 왜군 장수를 쏘아 거꾸러뜨린 후 머리를 베고 큰 칼을 노획한다. 큰 칼은 자루가 길고 칼날이 등 쪽으로 휘어진 언월도(偃月刀)였는데, 칼날에 ‘모루미치(盛道) 작(作)’이라는 제작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이 칼은 도요토미 히데요시(豐臣秀吉)가 다이묘(大名)급 장군에게 하사한 칼로 알려져 있다.
-진주성으로 달려가다 최경회는 장수에서 남원으로 진을 옮긴다. 전라도 진격에 실패한 왜가 경상도로 물러났기 때문이다. 최경회가 남원에 머무르고 있을 때, 영남 의병장 김면과 경상우도 관찰사 김성일이 원군을 요청한다. 최경회의 부장들은 “지금 적군의 기세가 사방으로 뻗치고 있는데, 어찌 호남을 버리고 멀리 영남 우도를 구원해야 하느냐”며 구원 요청을 반대하였다. 이때 최경회는 “호남도 우리 땅이요, 영남도 우리 땅인데 의(義)로써 일어난 사람들이 멀고 가까움을 가리겠는가”라고 말하면서, 경상도로 달려간다.
최경회는 전라우의병을 이끌고 진주 살천에 주둔하면서 제1차 진주성 전투를 외곽에서 지원한다. 이는 제1차 진주성 전투에 대한 경상우도 관찰사 김성일이 경상도 지역의 전투 상황을 보고한 장계에 “경상도 의병장 곽재우는 동쪽으로부터 들어가고, 전라 의병 최경회는 서쪽으로부터 들어가고, 고성 의병장 조응도는 남쪽으로부터 들어가게 하였습니다”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제1차 진주성 전투 당시 보성 출신으로 전라좌의병을 이끈 임계영도 함양으로 진출했다.
진주목사 김시민은 최경회를 비롯한 전라 의병장들의 외곽 지원을 받아 제1차 진주성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다.
당시 최경회와 임계영의 의병부대는 막강했다. 1592년 12월 9일자 ‘선조실록’에 “각도의 의병 가운데 곽재우·최경회·임계영이 거느린 군사는 쓸만해 보입니다. 이들 세 사람이 바야흐로 경상도에 있으니 급히 군사를 정돈하여 근왕(勤王)케 하자”는 비변사의 건의를 통해서도 짐작된다. 그러나 비변사의 건의는, 경상도에서 전라도 의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상소가 잇따르자, 철회된다.
1593년 3월 경상우병사 김면이, 동년 4월에는 경상우도 관찰사 김성일이 전염병으로 쓰러진다. 그러자 조정에서는 최경회를 경상우병사에, 김륵을 경상우도 관찰사에 임명한다. 그런데 경상우도 관찰사에 임명된 김륵이 전시에 관찰사 업무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 조정에서 논란이 일었고, 그 대체 인물 1순위가 경상우병사에 임명된 최경회였다. ‘선조실록’에는 “최경회는 새로 병사(兵使)에 임명되었는데, 이 사람은 침착하고 중후하며 지략이 있어 감사(監司, 관찰사)에 합당하니, 그로 하여금 대신하게 하소서. 그 다음으로는 이시언과 곽재우도 임명할만 합니다”라고 대신이 아뢰고 있다. 당시 최경회가 임명되지는 않았지만, 이시언과 곽재우를 제치고 경남우도 관찰사 제1순위 후보였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진주 남강에 몸을 던지다 제1차 진주성 대첩은 임진왜란 최초로 성을 지켜낸, 전라도로 진출하려던 왜군의 계획을 좌절시킨 귀중한 승리였다. 그러자 이듬해인 1593년 7월, 왜군은 전라도로 통하는 관문을 확보하고 제1차 진주에서의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 10만의 병력을 집중하여 함안·의령을 차례로 점령하고 진주성을 공격한다. 당시 조정은 방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진주성을 포기하라는 명을 내렸고, 도원수 권율과 경상도 의병장 곽재우마저도 진주성에서 10만의 왜군을 상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여 반대한다. 심지어 곽재우는 진주성에 입성하는 충청병사 황진에게 “진주성은 고성(孤城)이어서 지키기 어렵고, 그대는 충청도 절도사인데 진주성을 지키다 죽는 일은 맡은 바가 아니다”라고까지 하였다.
조정이 포기하고 경상도 의병장 곽재우마저 포기한 진주성을 지키기 위해 진주성에 들어간 것은 김천일, 최경회, 고종후, 황진 등이 이끄는 3천5백의 호남 의병과 진주목에 머물던 관군 뿐이었다.
진주성에서는 새로 지휘부가 구성된다. 총사령관 격인 우도 절제사(節制使)는 창의사 김천일이, 좌도 절제사는 경상우병사 최경회가 맡아 의병은 김천일이, 관군은 최경회가 군령을 내렸다. 도순성장(都巡城將)은 충청병사 황진의 몫이었다.
1593년 7월 22일부터 시작된 제2차 진주성 전투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다. 관군과 명군의 지원 없이 9일을 버텨냈지만, 28일 충청병사 황진이 이마에 탄환을 맞고 사망하였고, 29일 성이 함락된다.
진주성이 함락되자 경상우병사 최경회는 “촉석루의 세 장사는(矗石樓中三壯士)/ 한잔 술을 들고 웃으며 긴 강물을 가리키네(一杯笑脂長江水)/ 긴 강물은 도도히 흘러가는데(長江之水流滔滔)/ 저 물결 흐르는 한 혼도 죽지 않으리(波不竭兮魂不死)”라는 시를 남기고 남강에 몸을 던진다. 그의 나이 예순 둘이었다. 이 시 속의 세 장사는 창의사 김천일과 고경명의 장남인 복수의병장 고종후, 최경회 자신을 가리킨다.
왜군은 진주성을 함락했지만, 큰 손실을 입어 전라도 진출이 좌절된다. 전라도 의병들이 몸을 던져 그들을 막아낸 것이다.
삼장사 시비(충의사 경내)
노성태·남도역사연구원장
최경회가 진주 남강에 투신한 지 150여 년 뒤인 1746년(영조 22), 최경회의 도장(圖章)이 남강 물가에서 발견되었고, 영조는 도장을 넣는 갑을 만들어 소중히 보관하게 한 뒤 ‘충절’의 상징으로 삼는다.
일휴당 최경회, 1753년(영조 29) 충의(忠毅)라는 시호가 내려지고 좌찬성에 추증된다. 그리고 진주의 창렬사, 화순의 삼충각에 배향된다. 2003년 화순군 동면 백용리에 건립된 충의사에는 사당을 비롯하여 기념관, 동상, 어록비 등이 있다. 후처로 ‘의암’에서 왜장을 껴안고 진주 남강에 투신한 논개의 영정을 모신 ‘의암영각’도 있다.
<노성태·남도역사연구원장> 기자 admin@slotnara.info
관련링크
- http://1.ruw534.top 0회 연결
- http://74.rqa137.top 0회 연결
- 이전글chgame.co.kr 펀치바둑이게임 {℡O!O. 7-4-6-5×3.4.6.4} 2025.11.13
- 다음글카지노릴게임 ㎴ 2.rbh443.top ㎴ 이벤트릴게임 2025.11.13